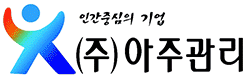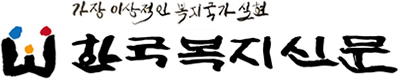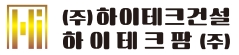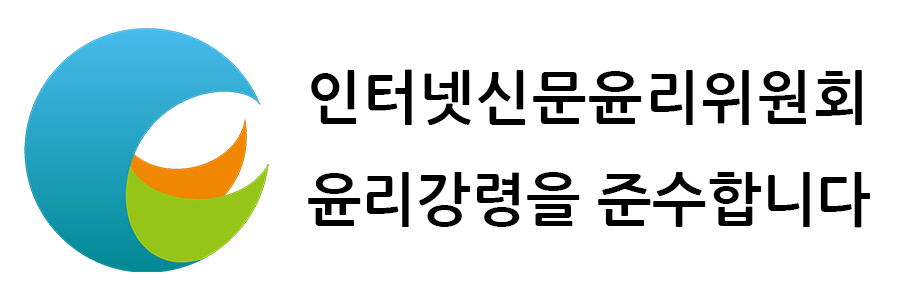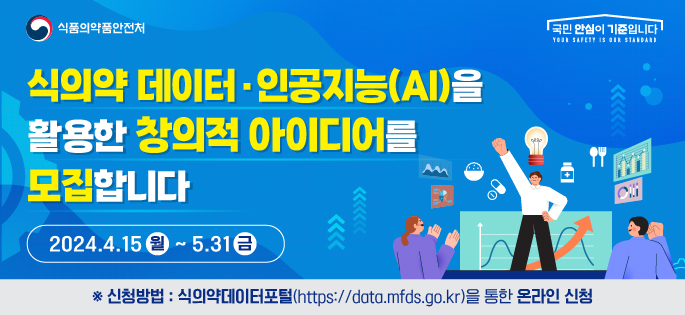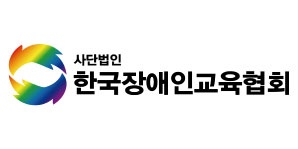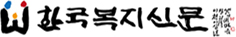[전문가 컬럼] 손암 정약전⑲ 총명했던 손암의 아들 ‘학초(學樵)’
임 송 문화예술학 박사
여수필하모닉오케스트라 대표 예술감독
- 전주영 기자
-
등록 2022.10.10 09:23
수정 2022.10.10 10:00

[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전주영 기자= 17세에 죽은 손암의 아들
손암 정약전은 해남 현감과 정5품 사간원 헌납(獻納), 시강원 사서(侍講院司書)를 지낸 김서구(金敍九, 1725~?)의 딸 풍산 김씨와 혼인하여 여러 번 아들을 낳았지만 모두 일찍 여의고 만년에 아들 학초(學樵, 1791~1807)를 얻어 극진히 사랑하였다. 다산 정약용이 쓴 여유당전서 다산시문집 제16권에 들어있는 ‘형님의 아들 학초(學樵)의 묘지명(墓誌銘)’에 기록되어 있는 학초에 대한 글을 보면, 학초의 자는 어옹(漁翁), 소명(小名)은 봉륙(封六)이었다. 어려서 말이 조금 서툴렀으나 7살이 되기 전에 이미 서사(書史)를 읽고 통달하여 일찍이 그 득실을 의논할 줄 알아 이를 보는 모든 이는 감탄하였고, 바둑을 신묘하게 알아내어 7~8세에 이미 어른들과 대국하여 모두 강적으로 여겼다.
- 학초는 10세에 이르러 학업이 날로 진취하여 지구(知舊)들 사이에 이름이 드날렸다. 다만 천성이 경전(經典)을 좋아하여 “시경(詩經)”ㆍ“서경(書經)”ㆍ“논어(論語)”ㆍ“맹자(孟子)”를 읽을 적마다 그가 질문한 의의(擬議)는 갑자기 대답할 수 없는 것이 많았고, 반드시 그가 스스로 해석하는 것을 들은 뒤에야 사리에 합당하였다.
가경(嘉慶) 신유년(1801, 순조 1) 봄에 화가 일어나서 손암 선생은 신지도(薪知島)로 귀양 가고 나는 장기(長鬐)로 귀양 갔다. 겨울에 다시 잡혀왔다가 다시 살아나 중씨(仲氏)는 흑산도(黑山島)로 정배(定配)되고 나는 강진(康津)으로 정배되어 형제가 같은 길로 길을 뜨게 되었다. 학초는 땋은 머리로 화성(華城)의 남쪽 유천(柳川)의 점사(店舍)에서 전송하였는데 그때 나이 11세였다. 집에 번국(番國)이 소산인 사안주(蛇眼珠) 1매가 있었는데 곧 큰 구렁이의 눈동자였다. 대체로 이 구슬이 있는 곳에는 뱀ㆍ독사 따위가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하고, 뱀ㆍ독사를 만날 경우에 곧 이 구슬로 비추면 뱀들이 모두 그 자리에서 죽어 마른 나무가 되어버리니, 기이한 보배였다. 학초가 울며 이 구슬을 바치면서,
“흑산도는 초목이 무성하여 뱀ㆍ독사가 많으니 이 구슬로 스스로를 보호하소서.”
하니, 손암선생이 받아서 주머니에 넣는 한편 눈물을 줄줄 흘렸다. 그리고는 드디어 서로 헤어졌다.
내가 유락(流落)한 이래로 저술한 육경(六經)ㆍ사서(四書)에 관한 학설 2백 40권은 학초에게 전하려 하였더니 이제는 그만이로다. - 이정섭(역) 1985
위 글에는 손암과 늦은 나이에 얻은 그의 아들의 이별이 애절하게 그려져 있다. 손암이 흑산도로 귀양살이를 떠날 때, 학초는 열한 살이었다. 당시에 그의 집에는 중국에서 들여 온 큰 구렁이의 눈으로 만든 사안주라고 하는 구슬이 있었고 그 구슬이 뱀을 쫓는 대단한 효력이 있다고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것 같다. 다산은 어린 학초가 흑산도로 유배를 떠나는 아버지께 유배지에 뱀이 많이 있을 것을 염려하며 그 사안주 구슬을 눈물로 손에 쥐어 드리는 애처로운 모습과 눈물겨운 생이별의 모습을 학초의 묘지명에 묘사했다.

조카의 총명함을 알아 본 다산
애절하게 작별한 아들은 7년 후에 장가를 간지 얼마 되지 않아 죽고 말았고, 유배지에서 이 소식을 전해들은 손암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헤아려 보지만 전해지는 바는 없다. 다산은 조카 학초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자신이 유배지에서 저술한 240권의 학설을 학초에게 전하려 했다는 것과 학초의 여러 가지 총명함에 대해 기술하였다. 다산에게는 두 아들 학연과 학유가 있었다.
큰 아들 학유는 초의선사를 아버지에게 소개하고 추사 김정희 등과 교우하며 문필을 드높이면서 다산의 유배 다음해부터 아버지의 유배가 억울하다는 상소를 다산이 해배 될 때까지 끊임없이 올린 인물이었다. 둘째 아들 학유는 현재에도 조선시대의 인문학자로 분류될 정도로 많은 문헌을 남기고 있다. 특히 시경에 나오는 모든 생물의 이름을 고증하여 해설한 생물백과사전인 ‘시명다식(詩名多識)’이라는 책과 ‘농가월령가’를 저술했다. 두 아들은 모두 유배 중인 아버지의 학문을 도왔던 뛰어난 학자들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두 아들이 있음에도 다산 정약용은 형님 손암 정약전의 아들 학초에게 자신의 새로운 학설을 전수코자 했다. 이는 숙부 다산이 알아 본 학초의 뛰어난 재주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 학초는 건륭 신해년(1791, 정조 15) 봄 2월 초 10일에 태어나서 가경 정묘년(1807, 순조 7)가을 7월 19일에 죽으니 그 수가 겨우 17세이다. 파평 윤씨(坡平尹氏)에게 장가드니, 상국(相國) 개(漑)의 후예이다. 광주(廣州) 초부(草阜)의 북쪽, 조곡(鳥谷)의 기슭, 두전(豆田)의 곁에 장사지내니, 그 무덤은 해좌(亥坐)인 듯하다. 명은 다음과 같다.
학문을 좋아하였는데 명이 짧아 일찍 죽으니 / 好學而短命死
하늘이 나를 자르고 하늘이 나를 망치었도다 / 天祝予天喪予
세상의 추향(趨向)은 날로 비하되고 / 世趨日以汚
선성의 도는 묵었도다 / 先聖道榛蕪
아! 재주없는 사람은 주색에 빠지고 / 噫下焉者酒淫
재주있는 사람은 날카롭기만 하니 / 上焉者尖碎
슬프다! 뉘라서 내 글 읽을 수 있으랴 / 而誰能讀吾之書噫 - 이정섭(역) 1985

손암은 유배 중에 고향 두물머리(지금의 경기도 남양주 마재)에 두고 온 아들의 부음을 들었다. 실로 통탄할 일이었다. 흑산도에서 살아가는 동안 사랑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된 절망과 좌절 속에서 그 외로움과 깊은 슬픔이 얼마나 컸을지 우리는 느낌으로만 추측 할 뿐이다. 손암은 당당한 풍채와 준걸한 풍모를 가졌고, 대단히 과묵하고 아주 다감한 사람이었다. 손암 정약전은 유배생활에서의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고 억울함을 항변하는 글을 단 한편도 남기지 않았다. 자신이 지은 서재의 이름인 ‘매심재(每心齋)’의 ‘매심’처럼 자기만의 방법으로 뉘우침의 삶을 살다 간 것이다. <다음으로 이어짐>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 1서울대공원, '시민들이 직접 만든 정원 보러 오세요'…오는 6월 말까지 …
- 2경기도, ‘참여로 바꾸는 우리마을’ 참여단체 모집
- 3시흥시, 버스정류소 스마트쉼터 확충
- 4용인특례시, 공공청사 에너지 절약 패러다임 바꾸다
- 5해양수산부, 2025년 ‘제17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경기도 시흥에서 열…
- 6경기도, 전국 최초 공익제보 안심전화번호 서비스 ‘누구나안심제보’ 도입
- 7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800개 비치
- 8서울장학재단, 예체능 고교생 대상 장학금 50만 원 증액으로 지원 확대
- 9고양특례시,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 52곳 구축
- 10사단법인 희망의소리, 통일교육주간 ‘청소년평화통일홍보대사’ 위촉식 열려